좀처럼 잡힐듯 잡히지 않던 작업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만세!). 마감에 코앞에 닥쳐서야 가닥이 잡히는건 정말 싫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럴 땐 스트레스를 한껏 받다가도, 뭐 정말 어쩔도리가 없다고 허허 웃어넘기는 인물을 슬그머니 연기해보기도 한다- 가령, 하루키 에세이에 등장하는 작가 다카하시 히데미네씨처럼 ‘아아, 이건 정말 곤란한데요.’ 라는 말을 하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난처해하는 인물. 오히려 그래서 더 가볍게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
논픽션 작가인 그가 취재를 하면 할 수록 ‘진실’?에 접근은 커녕 실제(혹은 실체)로부터 점점 멀어져만가며 열심히 곤혹스러워한다는 묘사를 읽으면서 자연스레 고개를 주억거렸다. 인생에 단 하루라도 완결된 서사가 있는 날이 있던가? 온갖 잡다하고 자잘한 일들로 가득한 일상 속에 길어올린 몇몇개의 스냅샷을 기어이 연결해 일기도 써보고, 에피소드도 만들어보고, 애써 서사를 이어붙인 이야기로 남기려는 노력 뿐인 것이다. 돈보다 일기장 같은게 없으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더 서러울 지도 모르겠다.
오늘 얻은 에피소드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다. 옆자리의 할아버지(왜 내 옆자리는 언제나! 할아버지들인가!!)와 우연찮게 나누게된 대화는 가벼운 시작에 비해 꽤나 무겁게 끝이 났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찾아간 카페안은 만원이었지만 커피를 주문하자마자 빈자리가 생겨 냉큼 앉았다. 작업을 한참하다 이어폰을 뽑아드니 옆자리의 웬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작업이냐며 호기심을 표한다. 적당히 이리저리 둘러대고 자리를 뜨려는데 뭔가 본격적으로 자세를 바꾸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길래,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답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지금 청년세대에게 있어서의 비젼, 혁명(은 너무 구시대적 느낌이지만)과 같은 매우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대체로 암울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다. 내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비관적이어도 되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돌아가지 않고 다른 식의 삶의 경로를 바꿀지, 지금으로선 아무리 머리를 끙끙대봐도 상상이 안간다. 지금껏 인생도 상상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예측대로 된 적도 거의 없긴 하지만.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뭔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무한 유예하는 느낌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 결정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게 좀 난처한 일이다. 하지만 뭔지도 모르는 것이라면 구태여 머리를 끙끙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간디, 링컨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몇몇 거론하던 그 할아버지는 곧이어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거라고 했다. 그러고선 자기자신을 바꾸지 않고선 다른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위인전에 나올법한 얘기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궁금한게 참 많으셨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프리랜서가 많은지,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는건지, 타블렛은 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나와 같은 젊은세대 (나로 상정이 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치자.)의 미래에 대한 상상 혹은 기대, 지금의 힘든 상황을 헤져나갈 수 있는(혹은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이나 선택은 무엇인지.. 주제선정?에 있어서 도약이 심한 대화였지만 어쩐시 수만번 머릿속에서 혹은 내 또래의 누군가와, 티비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수천 수만번을 더한 ‘살기힘든사회’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자니 나는 오히려 갑자기 오늘의 저녁메뉴 같은것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집에와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대로 펼친 시집에 공감을 느끼면서 어딘지 모르게 연약해진 것 같이 느꼈다.
소규모 인생계획 / 이장욱
식빵 가루를
비둘기처럼 찍어먹고
소규모로 살아갔다.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간신히 팔짱을 끼고
봄에는 조금씩 인색해지고
낙엽이 지면
생명보험을 해지했다.
내일이 사라지자
모레가 황홀해졌다.
친구들은 하나 둘
의리가 없어지고
밤에 전화하지 않았다.
먼 곳에서 포성이 울렸지만
남극에는 펭귄이
북극에는 북극곰이
그리고 지금 거리를 질주하는 사이렌의 저편에서도
아기들은 부드럽게 태어났다.
우리는 위대한 자들을 혐오하느라
외롭지도 않았네.
우리는 하루 종일
펭귄의 식량을 축내고
북극곰의 꿈을 생산했다.
우리의 인생이 간소해지자
달콤한 빵처럼
도시가 부풀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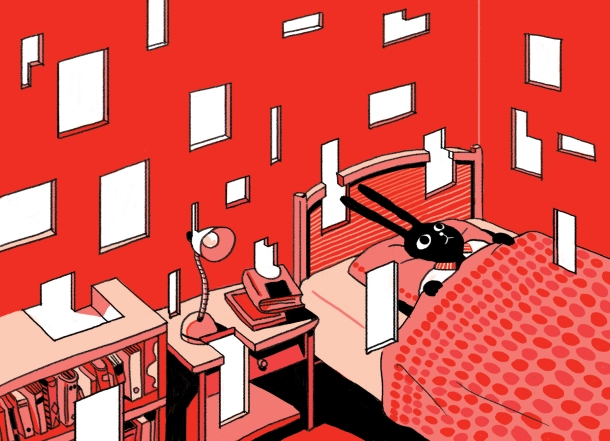
I don’t know what are you are saying but I love the illustration. Congratulations!
“인생에 단 하루라도 완결된 서사가 있는 날이 있던가? 온갖 잡다하고 자잘한 일들로 가득한 일상 속에 길어올린 몇몇개의 스냅샷을 기어이 연결해 일기도 써보고, 에피소드도 만들어보고, 애써 서사를 이어붙인 이야기로 남기려는 노력 뿐인 것이다. 돈보다 일기장 같은게 없으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더 서러울지도 모르겠다.”
밑줄 벅벅… 그 책에서 왜 또 이런 시가 꺼내들려져가지고- 어우우우- ‘수요일의 인사’ 남기고 가.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네 라고 쓰고 달력을 보니 오늘은 화요일이네. 긴 일주일이 될 것 같다… 한숨